삼별초
삼별초(三別抄)는 몽골 침략기에 그에 대항하던 고려의 무장 세력이며, 원래는 하나의 단일한 단체가 아니었다. 뒤에 삼별초의 난을 일으킵니다.
다른 반란군과는 달리 원래는 비정규군이었다가 정규군으로 재편된 군대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궤멸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나, 일부 세력이 류큐 왕국(오키나와 지역)으로 향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별초의 유래
별초(別抄)는 몽골 침입 이전부터 등장하는데, 기존의 정규 군사조직 이외의 새로이 편성된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별초는 지역별 별초, 신분별 별초 등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고려 전기의 군사 조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군사 조직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첫 등장은 무신정권 초반기에 발생한 조위총이 일으킨 반란 때부터입니다.
대몽항쟁과 관련하여서는 야별초 등이 주로 언급되지만, 지역이나 신분별 별초군 또한 대몽항쟁기에 활동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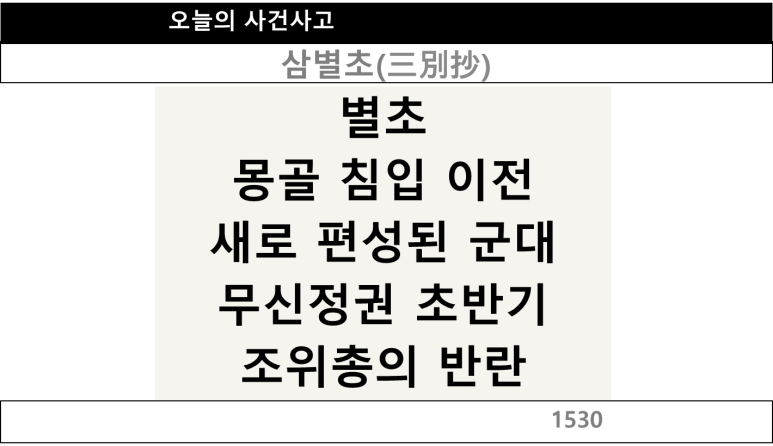
삼별초는 처음에 최우가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에서 유래합니다.
야별초는 1219년 최우가 권력 보호를 위해 조직한 사병이었는데, 뒤에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규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방의 직할 부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야별초는 다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으며,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거나 탈출한 이들로 이루어진 신의군을 포함하여 삼별초라 불렀습니다.
삼별초는 주로 경찰·군사 등의 공적(公的) 임무를 띠었으나 무인 정권기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에 가까운 조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지휘관에는 도령(都領)·지휘(指揮)·교위(校尉) 등의 무반관료들이 임명되어,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군조직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몽항쟁
1231년부터 몽골 침략이 시작되자 최씨 일가와 지배자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떠납니다.
1258년 김준이 최충헌의 증손 최의를 살해함으로써, 최씨 일가 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배자는 김준에서 임연, 그리고 다시 임연의 아들 임유무로 무신 지배는 승계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원종은 결국 몽골에 굴복했고, 대세는 이미 몽골에 굴복한 원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270년 음력 5월 원나라에서 귀국길에 오른 원종은 1270년 개경으로의 환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고려가 몽골에 의한 격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 간섭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자 임유무는 이에 저항합니다.
그러자 원종은 삼별초를 회유하여 임유무를 암살하여 100년간 왕권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던 무인시대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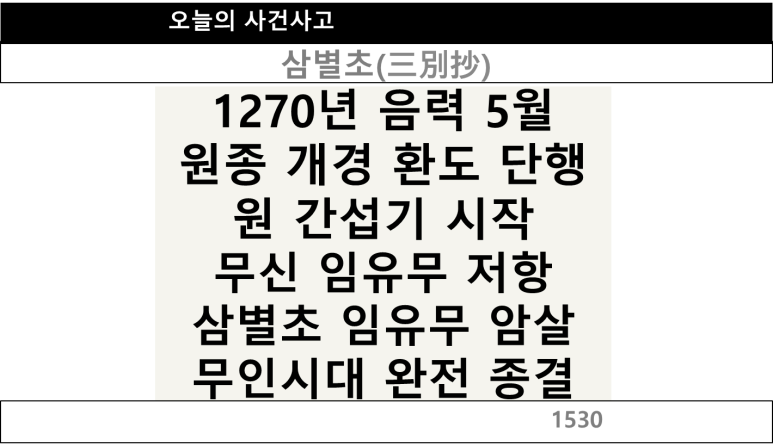
그러나 결국 1270년 개경 환도가 임박하자 삼별초는 몽골에 굴복한 왕에게 운명을 맡길 수 없었고, 내부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종은 삼별초에게 해산령을 내리고 그들의 명단을 거둬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연명부가 몽골군의 수중에 넘어가면 삼별초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삼별초 내에서 이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마침내 1270년 음력 6월 초, 개경 환도를 앞둔 시점에서 삼별초의 지도자였던 배중손과 노영희 등 삼별초 지휘자들은 항전을 결정합니다.
삼별초는 왕족인 왕온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강화도의 거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태운 대선단을 이끌고 진도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도의 대부분의 시설은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진도와 그 인근 지역에는 과거 최씨 정권이 소유한 대규모의 농장이 그때까지도 존재하였습니다.
동시에 진도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의 세곡이 서울로 운송되는 길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곡으로 운반되는 식량과 자금을 자체 군량으로 쓰는 동시에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용장사'라는 절을 임시 궁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용장사 주변에 산성을 쌓고 관아도 세웠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도는 제법 도읍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진압군은 속수무책이었던 반면, 이들은 남해안 일대를 석권하고 해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건설합니다.
그들은 또 고려의 정통 정부임을 자처하면서 일본에 사절을 교환하는 등의 외교활동도 하였습니다.
1270년 음력 11월에 이르러 삼별초군은 제주도까지 점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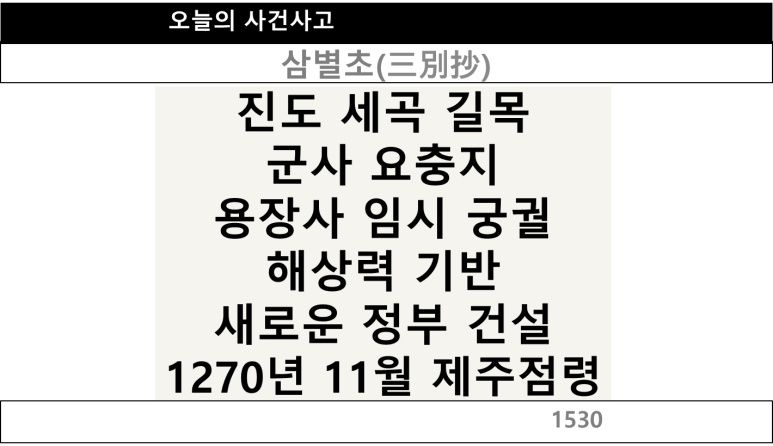
1271년 음력 5월 몽골에 의해 진압군이 조직되어 좌군·중군·우군, 즉 세 방향으로 나눠서 진도를 공격해왔습니다.
삼별초는 진도의 관문이었던 벽파진에서 중군을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별초가 중군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안, 그 틈을 타서 진압군의 좌군과 우군이 배후와 측면에서 기습 공격을 해왔고, 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휘자 배중손과 승화후 온은 살해되고 혼란에 빠진 삼별초는 흩어져 각기 피신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삼별초 병사들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혼란을 수습하고 제주도로 후퇴합니다.

그 후 제주도에 상당한 규모의 외성을 건립하는 등 여몽 연합군에 항거하며 일진일퇴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73년 음력 4월, 진압군 1만여 명이 제주도에 상륙하고, 삼별초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휘자 김통정은 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4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전은 막을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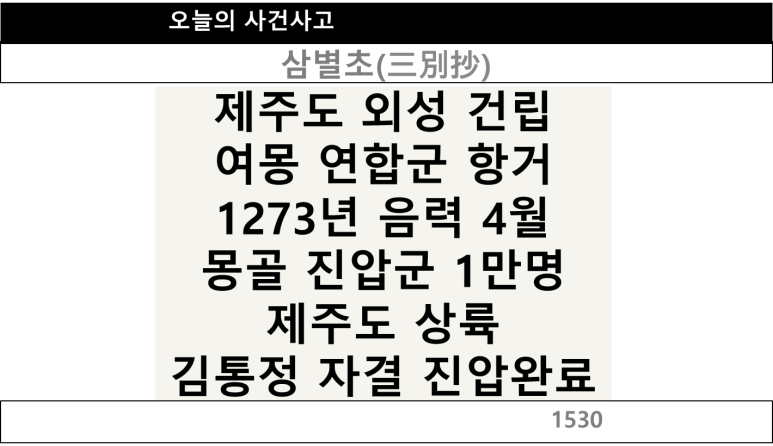
이상끝
'오늘의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달족의 로마 약탈 455년 (0) | 2025.06.02 |
|---|---|
| 신미양요 (0) | 2025.06.01 |
| 대한민국 제헌 국회 개회 1948년 5월 31일 (0) | 2025.05.31 |
| 탕구협정 (0) | 2025.05.31 |
| 잔 다르크 Jeanne d'Arc (0) | 2025.05.30 |



